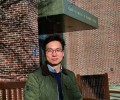| 꽃보다 누나 |
| 보스톤코리아 2014-01-13, 13:36:46 |
|
올해 겨울은 더딘듯 싶었다. 하지만 웬걸 오겠지 오겠지 하던 눈이 기어코 오고 말았는데, 폭설이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을 타고 눈발은 날렸다. 칼바람속에서 나무가지들이 부딪쳐 소리냈다. 눈치우러 나갔던 새벽추위는 여전히 견디기 쉽지 않았는데, 깔끔한 추위일테고 맑은 겨울 바람이었다. 게다가 치우지 못한 눈길에 운전길은 미끄러워 신경이 곤두섰던 터다. 한겨울, 독자 여러분 빙판 조심하기 바란다. 하긴 보스톤에서 겨울 서너차례 스노스톰이 없다면 그건 겨울도 아니다. 남정네들은 오빠라는 호칭에 간지러워 한다. 중년 여인에게 누나라는 말은 로망이다. 게다가 현기증까지 나는 모양이다. 내 아내에게 정말 그러냐 묻지는 않았다. 내게도 누나라는 말은 아련하므로 입안에서 맴돈다. 아주 젊은 시절이다. 아내에게 자주 강요했다. ‘오빠라 불러봐라’ 아내에게 욱박질렀던 거다.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다. ‘옴마, 옴마. 남사스럽게’ ‘오마나, 왠 이상한 요구.’ 아내 반응이다. 요샌 아주 흔한 말이다만, 오래전엔 자기라고 불렀던가. 기억도 가물거린다. 아내가 ‘자네’라고 부르지 않아 고맙다. 게다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다.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여전히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아내가 ‘영감’이라 부르지 않아 더욱 감사하다. 아내가 ‘서방님’이라 부른다면 그럴듯할지 모르겠다. 하긴 옛날엔,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말도 이상한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무엇이 되고 싶다/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 김춘수) 내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를 적에 항상 내이름을 불렀다. 어머니가 내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가 늘 대답했다. 내가 듣기에 날 부르는 것과 아버지를 찾는 톤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헌데, 아버지는 정확히 구별했다. 하긴, 어머니가 내 이름을 통해 아버지를 부를 적에, 아버지대신 내가 대답할 때도 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 해라.’ 내가 전령이 되어 아버지께 전달하는 거다. 하긴 내 이름이 불려지면, 내가 대답하는 건 매우 예의 바른 일이고 당연한 거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빠나 자기라 부르지 않았지 싶다. ‘여보’ ‘당신’ 하셨던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 금술이야 덤덤했기에 그랬던가. 불행이라면 불행인건, 내게 친누나가 없다는 거다. 그렇다고 누이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남동생도 없다. 형만 있다. 그렇다고, 교회 권사님들께 무례하게 ‘누나’라고 부르기에도 거시기 하다. 장로님들께 형님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것처럼 말이다. 하긴 한국에 돌아간 젊은 목사님은 나를 ‘형님 집사’ 라고 부르긴 했다. 그러니 교회 젊은 집사님들에게 나는 아주 이따금 ‘오빠’이고, ‘오라버니’다. 몇몇 젊은 집사들에게는 형이고 깍듯한 ‘큰형님’이다. 우린 조폭처럼 호칭한다. 대신 검은양복은 이따금 교회에서 입는데, 깍두기 머리는 아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꽃이 된다.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들꽃이고 잡초인지도 모르겠다. 불러주므로, 이웃에서 가족이 된다. 불러서 살가운 형과 아우. 불러서 꽃이된 누나. 꽃보다 누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객원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ditor@bostonkorea.com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