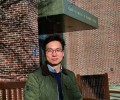| 윤사월 |
| 보스톤코리아 2014-04-07, 12:06:42 |
|
김초혜 시인이다. `한몸이었다/서로 갈려/다른 몸 되었는데/주고 아프게/받고 모자라게/나뉘일 줄/어이 알았으리/쓴 것만 알아/쓴 줄 모르는 어머니/단 것만 익혀/단 줄 모르는 자식/처음대로/한몸으로 돌아가/서로 바뀌어/태어나면 어떠하리`(어머니 1, 김초혜) 거울을 보고 있다가 혼자 중얼거렸다. ‘어어, 아버지 모습이 보이네.’ 듣던 아내가 말했다. ‘어디~이, 완전히 시어머니 얼굴이지.’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난 어머니를 닮았다. 하지만, 거울속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그건 착각이 아닌데, 아버지 얼굴 모습이었다. 오십대 중년 아버지 모습을 내얼굴에서 얼핏 봤다는 거다. 내가 머리 커가면서 보았던 아버지 모습이 내 머리에 각인되어 굳어졌을터. 그때 이미 아버지는 오십줄을 훨씬 넘어섰으니, 이제 내 나이와 비슷 할게다. 씨가 있으니, 그 씨가 어디 가랴. 어머니는 당신의 음력생일에 나를 보셨다. 그러니, 어머니와 나는 생일이 다른데 같다. 그날 처음대로 한몸되어 내 부모님과 바뀌어 태어나면 어떨 것인가. 그 해에는 윤삼월이 있었다 했던가. 올해는 윤달이 구월에 있다. 난 윤달은 사월에만 있는줄 알았다. 윤사월은 목월의 시를 떠올려서 그런가 보다. 고등학교 일학년때인가. 햇빛이 그윽한 봄날 아침 국어시간. 선생이 읽어주던 윤사월 시에 내 스스로 눈을 감았다. 엷은졸음인지, 깊은 음미인지 그건 구별이 쉽지 않았다. 송화(松花) 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 (윤사월, 박목월) 글이나 시나 읽을 적 마다, 감흥이 달라진다. 하지만 유난히 이 시 ‘윤사월’ 만큼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시를 떠올릴 적마다, 여전히 현기증이다. 회충약 산토닌 먹은 날처럼, 가볍게 어지럽고 입안이 마른다는 말이다. 시인은 색을 활자로 만들지 않았다만, 시의 배경은 연노란색일게다. 노란색은 나를 어지럽게 하니 더하다. 봄햇살은 병아리색이고, 송화가루는 연노란색이다. 내집 뒷마당에도 송화가루 흩날려 앞이 흐려 질게다. 소나무가 짝을 찾는 노력일텐데, 송화가루 날려 보내 새 소나무를 잉태 할 수있을까. 새 소나무를 낳는다면 자연은 누가 어미이고 누가 새끼인지 안다. 다음 윤사월은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잠언 4:3)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의견목록 [의견수 : 0]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
| ||||||
| ||||||
| ||||||
| ||||||
| ||||||
 프리미엄 광고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ditor@bostonkorea.com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